
개인적으로 스포츠 관람을 좋아해서 1년에 몇 차례는 야구장을 찾았다. 그런데 최근 프로야구 입장권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곧 시작되는 ‘가을 야구’를 보려면 치열한 티케팅 경쟁을 뚫어야 한다.
국내 프로야구의 성장세가 놀랍다. 2024년 총관중 수가 1088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고 올해는 지난주에 이미 1200만 명을 돌파했다. 리그 전체 수입은 6800억 원을 넘어섰고 7개 구단이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인기 회복을 넘어 프로야구가 본격적인 산업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프로야구 인기가 어떻게 다른 프로스포츠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는지, 예전 ‘오빠부대’를 몰고 다녔던 프로농구의 인기는 왜 상대적으로 시들었는지 궁금했다. 여러 분석을 종합하면 프로야구의 성공 요인으로는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올드팬층, 각 구단의 적극적 투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의 좋은 성과, MZ 세대의 성공적 유인과 응원 문화,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팬 기반 확대, 효과적인 선수 마케팅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실 쉴 새 없이 골이 터지고 랠리가 이어지는 농구나 배구에 비해 야구는 느리다. 예전에는 야구가 지루해서 재미없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느슨함이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수마다 다른 응원가, 스트라이크 아웃 때의 댄스, 그리고 공수 교대 시간의 각종 이벤트가 그것이다. 야구장은 젊음을 발산하는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됐다.
프로야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 메이저리그(MLB)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MLB는 연간 약 12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그 절반 이상을 방송권 수익에서 얻는다. 뉴욕 양키스는 자체 스포츠 네트워크를 통해 10조 원대 구단 가치를 창출했고 볼티모어 오리올스 같은 중소 구단조차 2조 원에 거래됐다. 이들은 단순한 기업 홍보 수단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기능하며 투자와 매각이 자유롭다.
반면 한국 프로야구는 아직 대기업 지원에 의존한다. 구단 매출의 약 3분의 1이 모기업의 광고와 스폰서에서 나오고 모기업 경영이 흔들리면 구단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이는 구단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변화가 보인다. 관중 증가와 함께 굿즈 판매 같은 수익 다각화가 이뤄지고 팬층의 변화도 눈에 띈다. MZ 세대와 여성 팬의 유입은 응원 문화에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앞으로 프로야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몇 가지 변화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배구조의 혁신이다. 구단 지분을 외부 자본에 개방하고 투자 펀드나 전문 스포츠 그룹의 참여도 고려하면 어떨까. 콘텐츠와 방송권 전략 재편 또한 병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단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다국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다. 스타 선수의 브랜드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오타니 쇼헤이가 수천만의 팬을 사로잡았듯이 한국 역시 젊은 스타를 글로벌 아이콘으로 키우고 스토리텔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의 핵심 수익 사업을 준비하는 것 또한 과제다.
프로야구의 혁신과 성장은 다른 스포츠는 물론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핵심 상품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타를 육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팬들 스스로 콘텐츠를 즐기고 소비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출 확대는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다. 프로야구의 성공 방정식이 다른 프로스포츠와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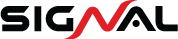





!["두나무 합병 효과 제대로네"…네이버 사흘 연속 강세[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9/29/2GY391THO6_3_s.jpg)
![네이버 1위, 카카오 2위…매수 이유는 제각각[주식 초고수는 지금]](https://newsimg.sedaily.com/2025/09/29/2GY3A5AZ7M_3_s.png)
![코스피 4거래일만에 반등…외국인·기관 쌍끌이[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9/29/2GY39YUNKC_3_s.jpg)
![네이버-두나무 '빅딜'에 쿠콘이 웃은 이유는[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9/27/2GY2CM26TH_1_s.jpg)
![[단독]자금줄 막힌 기업…회사채 발행 3분기만에 100조 넘겨](https://newsimg.sedaily.com/2025/09/29/2GY3ARHG8K_8_s.jpg)
![SK하이닉스, "내년 영업익 50조" 전망에 순매수 1위[주식 초고수는 지금]](https://newsimg.sedaily.com/2025/09/26/2GY1WHLKOU_3_s.png)

![러시아에 날 세운 트럼프…“침공 시 격추” 발언에 방산株 ‘들썩’ [줍줍리포트]](https://newsimg.sedaily.com/2025/09/24/2GY0YDTDY8_3_s.jpg)

![코스닥 대장주 또 떠나네요…코스피 이전 선언에 주가 강세[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9/29/2GY39Q9GQB_3_s.jpg)


![[단독]"여천NCC 대여금, 필요시 출자전환"](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3KGWFY_3_s.jpg)

![[단독]효성, 페라리와 합작사 설립…수입권 사업 떼어낸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S2GFZY_2_s.jpg)

!["135만호 주택 공급에 호재 터졌다"…건설株, 일제히 급등 [줍줍 리포트]](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LJVRTY_3_s.jpg)

![[단독]M&A 직후 영업정지…IMM, KKR 상대 최소 수백억대 손배소](https://newsimg.sedaily.com/2025/09/22/2GY02VQ4GK_2_s.png)
![[단독] EQT파트너스, 더존비즈온 인수한다…공개매수도 추진할 듯](https://newsimg.sedaily.com/2025/09/18/2GXY8NAA25_4_s.png)
